[20세기소년 추방史] #39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민주주의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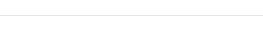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민주주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의 기본 원리는 어디나 똑같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방식 그대로 타인을 존중하라. 이게 잘 안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릴에 온 첫날 최승희 씨와 그의 남자친구이자 서른 살의 프랑스 청년 뱅상과 저녁을 먹었다. 식사 도중 우리는 백화점이나 공공건물에 들어설 때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가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문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물었다. 한국에서도 그렇습니까? 물론 프랑스 사회에서 그건 기본 매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선 그렇지 않다. 나는 그게 단순한 문화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얼버무릴 수 없었다.
관용과 배려는 존중 받고 싶은 방식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미덕이다. 관용은 타인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고 배려는 타인의 취약함을 존중하는 태도다. 어떤 자유, 어떤 권리든 이 두 가지를 뛰어넘어 존재할 수 없다. 같이 사는 사회이니까.
한국 사회의 관용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한국 사회의 배려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그걸 논하는 게 어불성설처럼 느껴진다. 혐오와 배척 지수를 따지는 게 더 쉬울지 모른다. 주류적 기준과 가치관에서 벗어난 이를 관용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내 권리를 먼저 생각한다. 다른 생각, 다른 삶의 태도에 대한 집단 이지메가 횡행한다. 인간관계에선 털끝만큼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21세기 한국인의 초상이다.
모두가 관용하지 않고 모두가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 오래 익숙하다 보면 자신이 성마른 품성을 가졌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한국 사회의 아득한 절망감은 거기서 비롯되는 것일 터이다. 알지 못하고 성찰하지도 않으니 개선될 여지도 없는 것이다.
해외에 오래 나와 있으니 한국이 그립다. 내가 그리운 것은 그 나라의 산과 강이지 사람들이 아니다. 이웃끼리 정이 넘치고 이것저것 퍼주려 하고 폐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 같다. 한 30년 전쯤? 30년 동안 우리는 정치 분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얻었을지언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망각했다. 어떤 이들은 이걸 인정하는 것조차 힘들어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을 준다.
_ written by 영화평론가 최광희 / @twentycenturyboy
20세기소년 추천사
#01 안갯속의 여행자
#02 분실
#03 근대 정신
#04 가짜 뉴스
#05 충동위로
#06 자유의 일상성
#07 민중의 사고방식과 언어
#08 시민 의식
#09 여행자의 눈
#10 고향
#11 용기
#12 인연
#13 메타포
#14 그리움
#15 극기
#16 짝
#17 길동무
#18 내일 일
#19 단절
#20 호의
#21 민족
#22 갑질
#23 도착통
#24 우연의 산물
#25 중국 음식점
#26 불쌍한 표정
#27 계획
#28 감시
#29 이유
#30 오르막
#31 장애
#32 동기
#33 목적지
#34 무뢰한
#35 폐
#36 탈출
#37 네 멋대로 해라
#38 전면 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