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소년 추방史] #16 짝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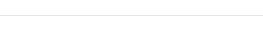
짝
푸엔테의 알베르게 역시 빈 침대가 많다. 내가 묵고 있는 도미토리에는 침대가 12개인데 영어를 전혀 못 하는 스페인 부부와 중년의 남자 한 명, 나까지 모두 4명만 누워있다. 아침 6시인데 밖은 아직 깜깜하고 아직 아무도 일어날 기미가 없다. 나만 슬쩍 일어나 공용 공간에서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잠을 깨웠다.
한국에서 귀마개를 사 왔지만 아직 한번도 쓴 일은 없다. 다른 이의 코골이에 잠을 방해받지 않도록 늘 내가 가장 먼저 잠들기 때문이다. 론세스바예스의 도미토리에서 내 바로 앞 침대에 있던 이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른 침대로 가 있던 걸로 보아 아마도 이들은 내 코골이에 적잖이 방해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알베르게는 길 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순례길에 온 이들이 각자의 모험담과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벨기에에서 온 조이는 지난 9월 중순까지 순례길을 걸은 뒤 한 달도 안돼 다시 왔다고 말했다.
“집에 있으니 갑갑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길에 오면 사람을 만나거든. 한국에 있는 내 여자친구가 나더러 까미노 마스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지.”
그는 마리화나를 익숙한 솜씨로 말아 피우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자랑인즉 2년 전 순례길에서 32세의 한국 여성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였다. 듣자니 너무 드라마틱해서 옮겨 적기에도 민망하다. 이야기의 말미에 그는 여성의 인종에 대한 강한 호불호를 드러냈다.
“유럽 여자들은 완전 별로야. 아시아 여성들이 최고지. 특히 한국 여성은, 세상에나,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아름다워.”
나는 서양 남자들의 아시아 여성 선호 이면에 놓인 제국주의의 흔적을 과민하게 체감하는 쪽이라 그 얘기가 불편했다. 그래서일까? 조금 유치한 맞불을 놓았던 것이다.
“유럽 여성들도 내 눈엔 아름다워.”
조이는 예의를 차리려는 듯 말했다.
“순례길에서 당신의 짝을 찾을지도 몰라.”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여행길의 로맨스는 홍상수 영화에나 존재하는 법이다. 게다가 나는 불과 100여 년 전의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성적으로 무능할 것이라는 인식론적 편견에 지배당한 바 있는 동양 남성의 유전자를 가졌다.
영화 ‘미이라’는 그런 면에서 서양인의 성적 오리엔탈리즘이 고스란히 투영된 영화였다. 이 영화의 2편에선 중국에 유물 도둑질을 하러 온 주인공 부자가 깨어난 진시황과 싸운다. 진시황의 전생의 애첩을 사이에 둔 싸움이다. 그러니까 동양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 서양과 동양의 남근이 한판 붙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우람한 서양의 페니스가 이긴다.
국제결혼이란 본질적으로 국가 간 불평등의 투영이다. 당사자들이야 이건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주장하겠지만 20세기 아시아 여성들은 서양 남자가 속한 사회의 풍요 속으로 도망쳤고, 지금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한국의 농촌으로 시집와서 가난한 친정 식구들을 부양한다.
이런 생각을 하자니 “영어가 짧아 미안해요.”라면서 줄곧 내게 스페인어로만 말을 걸어오는 노년의 부부가 차라리 소박하고 정겹게 보인다. 도미토리를 전세 낸 듯 수다스럽지만, 저 나이에 부부 동반으로 순례길에 나선 게 여간 멋스러운 게 아니다. 부인은 어제 길 위에 난 무화과 열매를 따서 내게 건넸다. 걸으면서 베어 문 무화과는 천상의 맛이었다. 나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벨기에 남자의 아시아 여성 상찬을 듣는 것보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순수한 호의의 순간이 훨씬 더 좋았다.
_ written by 영화평론가 최광희 / @twentycenturyboy
20세기소년 추천사
#01 안갯속의 여행자
#02 분실
#03 근대 정신
#04 가짜 뉴스
#05 충동위로
#06 자유의 일상성
#07 민중의 사고방식과 언어
#08 시민 의식
#09 여행자의 눈
#10 고향
#11 용기
#12 인연
#13 메타포
#14 그리움
#15 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