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소년 추방史] #17 길동무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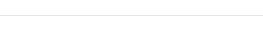
길동무
알베르게에서 주섬주섬 짐을 챙겨 길을 나섰다. 오늘도 24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데 무릎 상태가 영 좋지 않다. 팜플로냐에서 하루를 쉬었는데도 어제 하루 걸었더니 통증이 제자리다.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한다.
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을 지나니 숲길 사이로 완만한 오르막길이 나왔다. 다리가 점점 더 아파오는 데다 짐의 무게 때문에 끙끙대며 올라가는데 한 여성 순례자가 손수레에 배낭을 실은 채 밀면서 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신기해 보여 얼른 카메라를 꺼내며 말을 걸었다. 발렌시아에서 왔다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알바이며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순례길을 걷고 있다고 서툰 영어로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잠시만이라도 내가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을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한 동양인 순례자가 역시 알바에게 다가오며 소리쳤다.
"오우, 재미있는 장면이군.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꽤 나이가 먹어 보이는 그는 자신은 홍콩 출신이며 몇 년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어느새 그와 나는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내 이름은 잭 챈이야. 잭키 챈이 아니라 잭 챈."
통성명을 한 뒤 그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홍콩에 있는 아내와 순례여행을 가네 마네를 놓고 대판 싸운 이야기부터 왜 홍콩인들이 중국 정부의 조치에 분개하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지까지, 화제가 이어지는 쪽으로 갈짓자로 말을 쏟아냈다. 나로선 약간 짜증 나는 스타일이었다. 어느 나라나 말이 많은 장년층은 있기 마련이다. 그도 한참 이야기를 쏟아내다 혼잣말을 되뇌었다
'난 참 말이 많아.'
알고 있는데도 잘 안된다면 기질이거나 오랜 습관인 것이다. 호젓하게 걷고 싶었던 순례길 초반의 욕심을 그가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무렵 다리 통증이 심해졌다. 나는 챈에게 좀 쉬어가자 제안했고 우리는 마을 어귀의 상점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챈이 내게 물었다.
"오래된 통증이요?"
"아니오. 첫날 산맥을 넘어오느라 그때부터 상태가 이렇군요."
그는 자신의 배낭을 뒤지더니 마사지 크림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걸 좀 발라요. 그리고 무릎 주변을 마사지해요."
그렇게 말하고 난 뒤 그는 먼저 길을 가겠다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챈이 시킨 대로 마사지 크림을 양쪽 무릎에 고루 펴 바른 뒤 2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배낭을 짊어매고 출발했다. 어라? 신기한 일이었다. 무릎의 둔중한 통증이 거의 사라진 것이다. 갑자기 다리가 가벼워졌다. 남은 10킬로미터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가벼워졌다.
다음 목적지인 에스테야까지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어쩌면 길동무가 필요한 이유다. 함께 길을 걷는 순례자들끼리는 조건 없는 호의가 작동한다. 생면부지의 한국인 중년 남성에게 선뜻 자신의 마사지 크림을 건넨 챈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순례길은 고통의 가시밭길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것도 그러거니와 그와의 대화도 살짝 성가시다 싶었지만 따지고 보니 걷는 동안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그러니 길 위에 사람이 없다면, 혹은 같이 걸어가는 길동무가 없다면 여행은 고행이 되기 십상이다.
길 위에 같은 지점을 향한 사람들이 있어 걸을 힘이 난다. 같은 목표 지점과 같은 여정, 그 딱 두 가지 요소만으로 어디에서 왔든 어떤 언어를 쓰든 흔쾌히 동지가 되는 것이다.
집단생활을 채택한 인간은 원래 서로 돕고 화목하도록 진화해 왔다. 서로 돕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탐욕의 정당화 시스템이 그 본성을 방해했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물어뜯고 경쟁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길 위에서는 삭제되었던 본성이 깨어난다.
오후 4시쯤 에스테야의 알베르게에 도착했더니 챈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내게 동네에서 맥주 한잔하며 같이 쉬자 했고, 나는 스포츠용품점에 등산용 스틱을 사러 갔다 오는 길에 적당한 바가 있으면 메시지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저녁 시간에 바에서 그를 기다리는데 챈이 이탈리아인 순례자와 함께 나타났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투닥거렸다. 얘기인즉슨 챈이 이탈리아 친구 크리스티앙이 묵은 알베르게에 체크인하러 갔는데 영어를 전혀 못 하는 지배인의 홀대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때 마침 크리스티앙은 샤워를 하고 있었던 터라 챈이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걸 몰랐던 것이고. 그게 서운했던 챈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네가 그 지배인 놈에게 좀 있다가 쬐그만 중국인 남자가 올 테니 네가 있는 방으로 안내해 달라고 미리 얘기만 했어도 내가 그런 막돼먹은 놈에게 홀대는 안 당했을 거야."
크리스티앙도 응수했다.
"그건 내가 미안해요. 하지만 챈, 당신은 너무 공격적으로 말을 해."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딱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길에서 만나면 호의를 주고받던 사이도 집에서 만나면 싸운다.
_ written by 영화평론가 최광희 / @twentycenturyboy
20세기소년 추천사
#01 안갯속의 여행자
#02 분실
#03 근대 정신
#04 가짜 뉴스
#05 충동위로
#06 자유의 일상성
#07 민중의 사고방식과 언어
#08 시민 의식
#09 여행자의 눈
#10 고향
#11 용기
#12 인연
#13 메타포
#14 그리움
#15 극기
#16 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