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소년 추방史] #15 극기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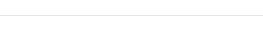
극기
론세스바예스에서 버스를 탔다. 왼쪽 무릎이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태다. 행선지를 건너뛰어 그나마 처음 나오는 도시인 팜플로나에 여장을 풀고 하루 쉬기로 한다. 어제 번갈아 신은 두 켤레의 젖은 양말도 말려야 한다.
죄책감은 없다. 까미노 첫날, 출발지 셍장의 알베르게 주인장은 순례자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며 강조했다. “신의 목소리보다 당신의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난 창창한 나이가 아니다. 20킬로미터 이상 걸으면 늘 무릎 관절에 탈이 난다.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온 직후부터 아주 길고 가파른 내리막길에 계속되는데 스틱 한 개로는 무리였다. 결국 하산길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무릎이 탈이 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노선버스를 타고 1시간여 달려 팜플로나에 점심 무렵 도착했다. 아침에 예약해둔 작은 호텔 방에 몸을 부리니 살 것 같다. 겨우 이틀 밤인데 나는 도미토리의 이층 침대가 옹색하기만 했던 것이니 거기서 나보다 옹색하게 잔 뒤 아침 일찍 백팩을 메고 출발한 젊은 유러피안들에게 괜한 열패감이 든다. 이것은 제국주의 정신인가? 오지에서의 불편함을 흔쾌히 감수하는 저 정신의 힘으로 저들은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태평양을 발아래 두었던가?
유약함으로 따지면 나는 반도의 갑이었다. 식민지 출신 룸펜의 유약함은 쓰레기 하치장 같은 방에서 자고도 한 달에 한번 청소하는 생활 습관을 몸에 배이게 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개인위생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기 마련이다. 거기서 겨우 벗어났던 것은 그래야 결혼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쩌면 결혼은 내게 신분 상승이었다.
그런데 스페인 북부의 낯선 땅에서 나는 왜 유약한가. 아니다. 이건 유약이 아니라 호사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무리하게 걷는 게 싫어 나는 내 인생에선 매우 드물게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군시절 36킬로미터 심야 행군 때도 나는 군장의 무게에 짓눌린 무릎 통증 때문에 고꾸라졌다. 그때 소대장은 내게 소리쳤다. “이까짓 걸 못 이기면 사회 생활은 어찌할 텐가?” 소대장은 극기와 인내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자였다. 사실은, 무릎 통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생활은 인내보다 현명함을 더 필요로 했다. 소대장의 극기 이데올로기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나 그와 같은 재래식 군인들에게나 필요한 미덕인 것이다.
오믈렛과 연어로 싼 야채와 토마토로 싼 치즈 덩어리를 점심 식사로 시켜놓고 나는 열심히 자기 정당화 중이다.
나는 여기 해병대 극기 훈련하러 온 게 아니다. 경험하러 온 것이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왔다.
_ written by 영화평론가 최광희 / @twentycenturyboy
20세기소년 추천사
#01 안갯속의 여행자
#02 분실
#03 근대 정신
#04 가짜 뉴스
#05 충동위로
#06 자유의 일상성
#07 민중의 사고방식과 언어
#08 시민 의식
#09 여행자의 눈
#10 고향
#11 용기
#12 인연
#13 메타포
#14 그리움
잘하셨어요. 한 번 나간 무릎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구요. :D
작가님 글 너무 찰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