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후기] Danny Mixon Trio at 스페이스 크리오 홀
Danny Mixon Trio at 스페이스 크리오 홀
2018/6/21
대니 믹슨이라고 했다. 딱히 들어본 이름은 아니어서 누굴까 싶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라고 했는데, 뉴욕이야말로 연주자들의 천국이자 지옥이다. 너무 많은 연주자들이 있으니 다 아는건 불가능하다. 게다가 스페이스 크리오 홀? 처음 듣는 공연장이다. 아무리 이십 년 동안 활동을 했다해도 안양의 작은 홀까지 다 꿰고 있지는 않다.
일단 어떤 상황이건 한 번은 연주를 한다, 그리고 난 뒤 판단하자 하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6월 21일 시간 어때? 하는 전화를 받고는 날짜를 비워두었다. 이 공연에 나를 추천해 준 사람은 벌써 십여 년 째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다 공연 업계에서 큰 일을 많이 하는 연출자라 굳이 이것저것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일이 추진된다.
문제는 공연 주최측에서 연주자 섭외만 이 양반에게 부탁했고, 담당자는 따로 있었다는 것이었다. 담당자가 보내는 카톡을 보니 공연 관련 업무를 거의 진행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대니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연주 동영상이나 음원을 보내달라고 말할때에는 약간 기분이 상했다. 섭외하기 전에 알아서 나의 커리어나 실력을 체크해 볼 수는 있을수 있겠지. 하지만 오랫동안 같이 공연을 해온 감독의 소개로 이미 섭외가 끝난 뒤에 너네들 얼마나 하는지 내가 좀 봐야겠다, 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마음이란게 그래서, 티가 날 듯 안 날 듯하게 사무적으로만 대하게 되었다. 공연이 다가와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달랑 공연 당일 낮 두 시에 사운드 체크 겸 리허설 한 번이라니, 아무리 재즈라도 좀 그랬다. 게다가 회원을 상대로 한 살롱 콘서트라고 했다. 점점 감이 오기 시작했다. 공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행사였군, 하는 느낌.
만나본 대니는 생각보다 더 나이가 들어보였다. 올해 칠순이라고 했으니 그럴만도 했다. 리허설 시간에 나는 이십 분 정도 일찍 도착했고 드러머가 십 분 정도 늦는 동안 둘이서 공연할 레파토리를 쭉 훑어보았다. 처음 만나는 사이니까 같은 곡이라고 해도 알고 있는 코드진행이 조금씩 다르고, 대니는 이런 저런 편곡을 해 둔게 있는 모양이었다. 이럴땐 계속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악기를 잡고 소리를 내보는 게 빠르다.
물론 악보는 없었다. 올드 스쿨, 그 자체. 곡을 쭉 치며 아, 거기 코드는 이렇게 바꾸고, 여기에는 이 리듬패턴을 같이 연주하는거야, 이 곡은 솔로를 이 두 코드를 계속 돌리면서 할 거고 하는 식이었다. 어려울 건 없지만 기억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 신경이 좀 쓰였다. 그렇게 일고 여덟 곡 정도 정리해보는 중에 드러머가 도착했고, 본격적으로 한 시간 정도 리허설을 했다.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대니의 표정이 풀려갔다. 이정도면 공연을 할 만하다는 생각을 한 모양이다.
샌드위치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젊었을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 아트 블래키의 재즈 메신저스에서 연주했다고 했다. 그리고 찰스 밍거스, 프랭크 포스터....재즈 역사의 한 중심에 섰던 이들과 함께 했던 거였다. 그리고는 그땐 좋았지, 지금은 어쩌구 하는 반쯤은 타당하고 반쯤은 고루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공연은 괜찮았다. 정말 엔터테인먼트로의 재즈 그 자체였다. 재즈를 처음 들어본 이들도 얼마간 섞여있는 관객이었는데, 한 두 시간 기분좋은 쇼를 감상하는 것과 같았으리라. 평소에는 관객을 위해 낮은 자세로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은 달랐다. 어쩌면 낮은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니는 저를 좀 봐주세요,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아 나를 봐라, 그리고 재즈는 원래 이런 음악이니 마음껏 즐겨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듯 했으니 말이다. 그런 당당함이 주는 힘이 분명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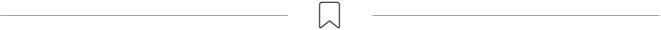
며칠 전에 썼던 글인데, 지금 읽어보니 제법 부정적인 느낌으로 읽히네요. 사실 공연은 즐겁게 잘 했습니다. 대니도 아주 만족해하며 공연을 마쳤구요. 주최측에게 다음에 한국에 또 온다면 꼭 얘네 둘하고 연주할거다, 그때는 리허설 하루, 공연 삼 일 잡아서 마지막 날에 라이브 레코딩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여담이지만, 자꾸 잘나가던 젊은 시절을 되새기는 할아버지에게 요즘은 누구랑 연주해? 하고 물으니 -영어라 반말로- 어 그게, 다들 저세상으로 가서 이제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하더군요. 적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불손한 태도에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았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당당한 연주를 할 수 있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좋으셨겠어요. 70세가 넘은 연주자라니.. 평생 직업으로 여행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불손한 것 까지는 아니었구요, 공연기획하는 쪽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살짝 의아한 기분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공연 일을 늘 해오던 분들이 아니라 그랬던걸로 이해했습니다 ㅎ
재즈 아티스트가 흑인분이신가요? 얼핏보면 백인분인것도 같은데... 그래도, 홀에 청객들이 아담하게 모이셔서 연주하는 맛이 났을것도 같습니다. 사실 저는 퍼포먼스보다 방에서 그냥 음악을 듣는 것을 즐기는 편이라 공연의 상황을 잘 모르긴 합니다. 읽는 재미가 잔잔합니다.
흑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감상하는데에는 집에서 음반으로 듣는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날 공연은 쇼적인 면이 많이 섞여있어서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구요. 역시나 공연은 공연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ㅎ
아아...
칠순이 되도록 연주활동을 계속한다는게 한편으로는 외로운 길이란 걸 상상해본 적이 없었더라구요 ㅠ
올드 스쿨이라 할만한 연주를 직접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마주 글이 페이아웃 되어서, 스팀과 스팀달러(요즘은 보상이 나뉘어 들어오니까요)를 전송드렸습니다. ㅎㅎ
시간을 좀 내어 제이미님의 오마주에 대한 감상을 쓰고 싶었는데 지난 주말까지 공연이 계속이라 정신이 좀 없었네요. 조만간 짬을 내야겠지요 ㅎ 여러모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