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37. 책도둑 by 마커스 주삭 - 모든 것은 책 속에 있다. 희망도, 길도, 구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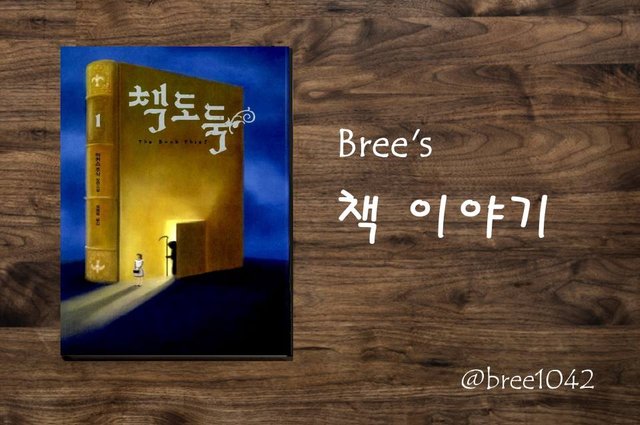
저승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 책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1938년의 독일이다. 처음 책을 펼쳐들면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다. 글의 전개가 여느 책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바로 책의 화자가 ‘저승사자 – 죽음의 신’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면 그 모든 게 이해가 간다. 저승사자는 자신이 잠깐 마주쳤던 9살 소녀 리젤 메밍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책에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녀의 아빠는 사회주의자여서 핍박을 받아왔다. 이대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엄마는 아이들을 키워 줄 양부모님을 물색해서 그들에게 아이들을 맡기지만, 양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동생이 죽게 된다. 아빠도 사라지고, 엄마도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고, 동생마저 죽게 된 리젤. 하지만 다행히 그녀의 양부모님은 무척 좋은 분들이었다. 입은 거칠지만 속정이 깊은 양엄마 로사 후버만, 한없이 다정하고 이해심 깊은 양아빠 한스 후버만, 그리고 바로 이웃에 살던 소년 루디 덕분에 리젤은 다시 활달하고 씩씩한 소녀로 살 수 있게 됐다. 그 활달하고 씩씩한 소녀를 갑작스레 철들게 만든 건 전쟁이었다.
이 책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글도 못 읽으면서 책을 훔쳤던 소녀 리젤이 글을 배우고 책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태인을 집 안에 숨겨주는 양아빠 이야기,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남의 집 지하실에 숨어사는 유태인 청년, 아이가 죽은 후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혀 살고 있는 서장 부인, 히틀러에 열광하는 사람들, 히틀러를 미워하는 사람들, 죽음을 피하는 사람들,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전쟁이 있다.
전쟁은 평범한 이웃을 죄인으로 만들고, 악의 없는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고, 열혈 청년을 살인자로 만들고, 소시민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들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되게 만든다. 하지만 이 책이 전쟁의 참혹함 보다도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건 바로 “글(책)의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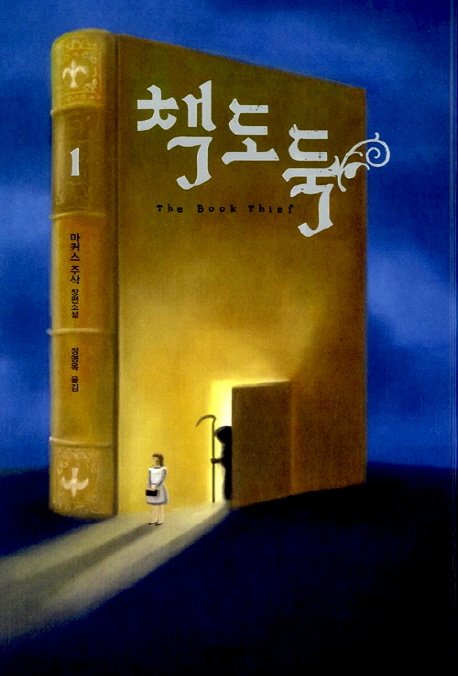
출처: 교보문고
총 두 권으로 되어 있다.
책, 그것은 슬픔이고 구속이다.
책 제목이 ‘책 도둑’인 이유는 주인공인 리젤이 책을 훔쳤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틀어 그녀는 모두 세 번 책을 훔친다.) 그녀가 처음으로 훔친 책은 동생의 시신을 묻어주었던 묘지 관리인이 자기도 모르게 떨어뜨린 <묘지 관리인의 지침서>였다. 가난으로 인해 더이상 아이들을 키울 수 없게 된 리젤의 엄마는 양부모에게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쏟아지는 눈을 뚫고 뮌헨으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그만 리젤의 동생이 죽고 만다. 아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낯선 마을에 내린 이들은 묘지 관리인을 부르고, 그들은 하얀 눈과 차갑게 얼어붙은 땅을 파고 동생을 묻기 시작한다.
Standing to Liesel's left, the grave diggers were rubbing their hands together and whining about the snow and the current digging conditions. "So hard getting through all the ice," and so forth. One of them couldn't have been more than fourteen. An apprentice. When he walked away, after a few dozen paces, a black book fell innocuously from his coat pocket without his knowledge.
A few minutes later, Liesel's mother started leaving with the priest. She was thanking him for his performance of the ceremony.
The girl, however, stayed.
Her knees entered the ground. Her moment had arrived.
Still in disbelief, she started to dig. He couldn't be dead. He couldn't be dead. He couldn't -
Within seconds, snow was carved into her skin.
Frozen blood was cracked across her hands.
Somewhere in all the snow, she could see her broken heart, in two pieces. Each half was glowing, and beating under all that white. She realized her mother had come back for her only when she felt the boniness of a hand on her shoulder. She was being dragged away. A warm scream filled her throat.리젤의 왼쪽에는 무덤을 파는 인부들이 손을 비비며 눈과 현재의 땅 상태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었다. "얼음 때문에 땅 파는 게 너무 어렵다고요."하면서. 그 중 한 명은 열 네살도 안 넘어 보였다. 도제다. 그가 몇 발자국 걸음을 옮겼을 때 검은 책 한 권이 자기도 모르게 코트 주머니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몇 분 뒤에 리젤의 엄마는 신부님과 자리를 떴다. 엄마는 장례를 집전해준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머물러 있었다.
소녀의 무릎이 땅을 파고들었다. 때가 왔다.
여전히 믿기지가 않아서 소녀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동생이 죽었을 리가 없다. 죽었을 리가 없다. 죽었을 리가 -
이내 눈이 소녀의 피부를 베었다.
얼어붙은 피가 소녀의 손 위로 갈라졌다.
이 눈밭에서 소녀는 자신의 심장이 두 조각으로 부서진 것을 보았다. 각각의 조각은 눈밭 아래에서 빛나며 뛰고 있었다. 소녀는 뼈만 앙상한 손이 자신의 어깨를 잡았을 때에야 비로소 엄마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걸 깨달았다. 소녀는 질질 끌려갔다. 따뜻한 비명이 그녀의 목을 가득 채웠다.
부모님을 떠나 양부모와 살러 가던 길. 엄마, 아빠와의 생이별,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집도 목적지도 아닌, 다시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어느 기차역 마을에 동생을 묻은 소녀의 마음. 손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파헤치며, 조각난 자신의 심장이 눈밭에서 뛰는 모습을 보며 소녀는 얼마나 울부짖었을지. 이런 상황에서, 그 소녀는 어떤 심정으로 인부가 흘리고 간 그 검은 책(제목은 <묘지 관리인의 지침서>이다. 소녀는 글을 모르니 무슨 책인지 몰랐겠지만.)을 아무도 몰래 옷자락 속에 넣었을까. 글도 읽을 줄 모르는 그녀가 그 순간 책을 움켜쥔 것은 아마도 그것이 그녀에게 동생의 마지막 기억을 (혹은 ‘가족’이라는 것의 마지막 기억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은 아닐까.
책, 그것은 안식이고 위로다.
우리를 억압하는 만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말(글)이다. 이 책에서 리젤을 구한 것은 책이었다. 책은 그녀를 어둠에서 구하고, 악몽에서 구하고, 폭격에서 구했다. 리젤 뿐만이 아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폭탄을 피해 지하실로 대피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것도 책이었다. 말과 글의 힘이었다.
밖에는 비행기의 공습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숨어 있는 이 지하 대피소는 충분히 안전한가? 이곳에 폭탄이 떨어져도 우린 살 수 있을까? 코 앞까지 다가온 숨막히는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틈에서 리젤은 (특별히 선별한 게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그 무렵 읽고 있었기 때문에) 대피소로 들고 왔던 책을 펼쳐 들고 소리 내어 낭독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선 끊어질 듯 팽팽했던 긴장감이 누그러들었고, 모두들 차분함을 되찾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리젤이 읽어줬던 건 평화를 말하는 철학 서적도, 종교 서적도 아니었다. 아주 흔한 범죄 소설, 그것도 리젤이 읽었던 그 부분은 마침 살인 장면이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도 리젤이 읽어주는 이야기는 모두를 지금 당면한 지독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책’은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문이었다.
When she turned to page two, it was Rudy who noticed. He paid direct attention to what Liesel was reading, and he tapped his brother and his sisters, telling them to do the same. Hans Hubermann came closer and called out, and soon, a quietness started bleeding through the crowded basement. By page three, everyone was silent but Liesel.
She didn’t dare to look up, but she could feel their frightened eyes hanging on to her as she hauled the words in and breathed them out.
...
Everyone waited for the ground to shake.
That was still an immutable fact, but at least they were distracted now, by the girl with the book.
...
Only when the sirens leaked into the cellar again did someone interrupt her. "We're safe," said Mr. Jenson.
"Shhh!" said Frau Holtzapfel.
Liesel looked up. "There are only two paragraphs till the end of the chapter," she said, and she continued reading with no fanfare or added speed. Just the words.
...
Out of respect, the adults kept everyone quiet, and Liesel finished chapter one of The Whistler.그녀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에야 그걸 눈치챈 건 루디였다. 그는 리젤이 읽고 있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며, 형과 누나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말했다. 한스 후버만도 가까이 왔고, 곧이어 조용함이 사람이 가득 들어찬 지하실에 번져나갔다. 세 번째 페이지를 읽을 무렵에는 리젤만 빼고 모두가 다 조용해졌다.
그녀는 감히 책에서 올려다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글자들을 책에서 꺼내들어 내뱉는 동안 그들의 겁에 질린 눈동자들이 그녀에게 매달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
모두들 땅이 흔들리기를 기다렸다.
그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지만, 적이도 이제는 책을 읽는 소녀 덕분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
...
지하 대피소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을 때에야 누군가가 그녀를 방해했다. "우리 안전해요." 젠슨 씨가 말했다.
"쉿!" 프라우 홀츠펠이 말했다.
리젤은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두 단락만 더 읽으면 이 챕터가 끝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팡파레도 없이, 속도를 높이지도 않은 채 계속 읽어나갔다. 글자들만.
...
존중해주는 마음에, 어른들은 모두를 조용히 시켰고, 리젤은 <더 휘슬러>라는 책의 첫 챕터를 끝마쳤다.
책, 그것은 구원이다.
추운 지하실에 숨어 살다 목숨이 위태로워진 유태인 막스에게도 리젤은 책을 읽어준다. 리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던 양아빠 한스는 그녀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책을 읽어줬다. 이 이야기 속에서 책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매개체로 나온다. 책은 괴롭기만한 현실을 잊을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정신이라도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우리의 멱살을 잡고 현실로 데리고 와서 눈앞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모든 책은 결국 자기 안의 이야기, 자기 주변의 이야기를 코 앞에 들이밀기 때문이다. 그 현실의 냄새가 너무나 지독해서 우리는 눈을 뜨고 코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된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거기에서 구원은 시작된다.
줄곧 책을 읽던 리젤은 나중에 자신이 직접 글을 쓰게 된다. 읽는다는 것과 쓴다는 것은 동일한 선상에 있다. 같은 악기로 연주하는 다른 선율이다. 글을 쓴다는 건 스스로를 구원하는 행위이자, 그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는 것이다.
우리는 읽어야 한다. 써야 한다.
책은 구원이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다른 이들과 실타래처럼 엮여서 세상이라는 비단을 짜내는 것이 바로 책이 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도, 인간에 대한 믿음이 스러져도, 깊은 슬픔의 바닥에 가라앉아도. 그래야 광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낱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으며, 슬픔에서 헤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글을 써야 한다. 나라를 빼앗겨도, 절망이 덮쳐와도, 세상이 무너져도. 글로써 현재를 기록하고, 내 마음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글을 쓰는 것. 그리고, 글을 읽는 것. 그것은 위대하다.
난해한 독후감을 마치며
이 책을 참 감명깊게 읽었는데, 줄거리를 요약하는 게 힘들다. 책을 읽으며 가슴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슬프기도 하고, 희망에 부풀기도 했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 줄잡아 50군데는 넘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여기에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 구절들 하나하나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구만리고, 가슴 아파 울고 싶은 마음이 한강이다. 그 모든 말을 일일이 다 적지 못하는 걸 용서해주시기 바란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직접 읽어보시라는 것뿐.
나를 깨우는 책 속 몇 마디
1.
Was he really a coward, as his son had so brutally pointed out? Certainly, in World War I, he considered himself one. He attributed his survival to it. But then, is there cowardice in the acknowledgment of fear? Is there cowardice in being glad that you lived? (p. 106)
그는 정말로 겁쟁이일까? 자기 아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지적했듯이? 분명 세계 1차대전 때는 그도 자신을 겁쟁이라고 생각했었다. 자기가 전쟁에서 살아남은 건 겁쟁이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두려움을 인정한다면 모두 겁쟁이가 되는 걸까? 살아서 기쁘다면 다 겁쟁이가 되는 걸까?
2.
아파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막스를 위해 리젤은 사소한 것들을 침대 옆에 갖다 놓는다. 선물로. 어서 깨어나라고.
Whenever she walked to and from school now, Liesel was on the lookout for discarded items that might be valuable to a dying man. She wondered at first why it mattered so much. How could something so seemingly insignificant give comfort to someone? A ribbon in a gutter. A pinecone on the street. a button leaning casually against a classroom wall. A flat round stone from the river. If nothing else, it showed that she cared, and it might give them something to talk about when Max woke up.
When she was alone, she would conduct those conversations.
“So what’s all this?” Max would say. “What’s all this junk?”
“Junk?” In her mind, she was sitting on the side of the bed. “This isn’t junk, Max. These are what made you wake up.” (p. 321)이제 리젤은 학교로 오갈 때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소중할 수도 있는 버려진 물건들을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그게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도 궁금했다. 이렇게 사소해보이는 것이 어떻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도랑에 버려진 리본, 길거리의 솔방울, 교실 벽에 아무렇게나 기대어 있던 단추 하나, 강가에서 주운 납작하고 둥그런 돌멩이. 이것들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리젤이 그를 신경쓰고 있었다는 건 보여줄 수 있었다. 그리고 막스가 후에 깨어났을 때 이야깃거리는 될 것이다.
혼자 있을 때면 리젤은 그때 나누게 될 대화를 상상하곤 했다.
"그래서 이게 다 뭐야?" 막스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쓰레기들은 다 뭐야?"
"쓰레기?" 상상 속에서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 "아저씨, 이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것들 덕분에 아저씨가 깨어난 거예요."
3.
저승사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자신이 거둬들인 영혼들을 떠올려 본다.
They were French, they were Jews, and they were you. (p. 350)
그들은 프랑스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유태인들이었고, 그들은 당신이었다.
4.
나치의 눈을 피해 리젤의 집 지하실에 계속 숨어살던 막스. 때마침 울린 공습경보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공동 대피소로 들어가버렸다.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 대피소로 피하지도 못하고, 홀로 리젤의 집에 남아있던 맥스는 거실로 올라와 오랜만에 밤하늘을 바라본다.
“I couldn’t help it,” he said.
It was Rosa who replied. She crouched down to face him.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x?”
“I…” He struggled to answer. “When everything was quiet, I went up to the corridor and the curtain in the living room was open just a crack … I could see outside. I watched, only for a few seconds.” He had not seen the outside world for twenty-two months.
There was no anger or reproach.
It was Papa who spoke.
“How did it look?”
Max lifted his head, with great sorrow and great astonishment. “There were stars,” he said. “They burned my eyes.” (p. 377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가 말했다.
대답을 한 건 로사였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그를 바라봤다. “막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는 대답을 하는 게 힘겨워 보였다. “사방이 다 조용해졌을 때, 복도를 따라 갔어요. 거실에 있는 커튼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어요… 난 밖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주 잠깐, 몇 초 동안 밖을 봤어요.” 그는 지난 22개월 동안 밖을 한번도 보지 못했었다.
아무도 화를 내거나 혼내는 사람은 없었다.
입을 연 건 아빠였다.
“어때 보였니?”
막스는 커다란 슬픔과 경이로 가득한 채 고개를 들었다. “별들이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눈이 부실 지경이었어요.”
5.
자신 때문에 막스가 위험에 처하게 된 건 아닐까 자책하는 아빠.
“Jesus, Mary, and Joseph.” Papa’s hands tightened on the splintery wood. “I’m an idiot.”
No, Papa.
You’re just a man. (p. 402.)"이런 세상에, 맙소사!" 아빠의 손이 깔쭉깔쭉한 나무 난간을 꽉 움켜잡았다. "내가 바보였어."
아니요, 아빠.
아빤 그저 사람인 거예요.
6.
리젤의 이웃집에서는 전쟁에 나갔던 두 아들 중 큰 아들만 손가락을 잃은 채 살아돌아왔다. 둘째를 잃은 슬픔에 상심한 엄마는 공습경보가 울려도 대피소로 피할 생각을 안 한다. 어서 대피하자고 엄마를 설득하다가 요지부동인 엄마를 놔두고 혼자서만 대피소로 들어온 큰 아들.
“Tell me something,” he said, “because I don’t understand …” He fell back and sat against the wall. “Tell me, Rosa, how she can sit there ready to die while I still want to live.” The blood thickened. “Why do I want to live? I shouldn’t want to, but I do.” (p. 487)
...
He killed himself for wanting to live. (p. 503)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로사 아줌마, 어떻게 우리 엄마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기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죠? 난 아직도 살고 싶은데." 피가 점점 배어나왔다. "난 왜 살고 싶어할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살고 싶어요."
... (중략)
그는 살고 싶어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목: 책도둑
원서 제목: Book thief
저자: 마커스 주삭 (Markus Zusak)
특이사항: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Disclaimer) 본문에 실린 인용은 제가 직접 번역한 것으로, 한국에 출간된 번역본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은 영어 원서로 읽었기 때문에 한국 출간본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독후감] 지난 독후감들 최근 5개 링크입니다.
@bree1042를 팔로우하시면 더 많은 독후감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32.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by 케이트 디카밀로 - 사랑을 잊어버린 어른을 위한 동화
33. 와일드 by 쉐릴 스트레이드 - 위험해도, 무서워도, 두려워도. 나는 계속 걸었다.
34.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by 정희재 - 목이 타는 한 여름에 미지근한 물
리뷰 잘봤습니다~
엄청 방대한 내용의 책 같네요.
네. 책도 굉장히 길어요.
원서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말로는 2 권으로 나뉘어 나왔어요.
그마저도 1권이 444페이지, 2권이 356페이지에요.
내용이 꽤 방대합니다.
책에 대한 브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에요. 이렇게 읽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책을 들기가 망설여져요. 그러나 역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번역본으로:D]
비극적 현실에서도 그녀에게 책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로한 건 헛된 희망도 아닌 다른 세계로 가는 책이었군요.
어떻게든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하고 또 글을 써야하죠. 아직 그럴 수 있는 한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너무 좋은 글이에요.
네.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면서도 끊임없이 책의 힘에 대해 알려줘요.
비록 픽션이긴 하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책이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 걸 생각하면 뭔가 뭉클한 게 있어요.
예전에 무지무지 재밌게 읽었었던 책이에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는 한참을 먹먹한 기분에 잠겨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
불이님의 감상글과 번역해주신 글들 잘 읽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전 책으로 읽고, 오디오북으로 한 번 더 들었는데 그때도 역시 울컥 하더라고요. ㅠ.ㅠ
요즘에 출퇴근길에 서서 책보는 습관을 붙이기로 하여 매일 책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책도둑'이라는 원작은 저는 영화로 먼저 접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동명으로 영화화 됐었는데, 브리님 글을 읽으니 역시 원작이 더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맞아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책보다 영화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방대한 내용의 책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요.
브리님의 책 아니 글에 대한 장문의 포스트를 잘 보고 갑니다. "따뜻한 비명"이라,,
전쟁영화는 많이 봐서 그 참혹함을 영상으로는 보았건만,,, 글로 읽는 참혹함은 영화 속 배우의 표정연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체워주는군요. 꼭 읽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머리로 상상이 되니까 더 참혹하고 슬픈 거 같아요.
책이 길긴 하지만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추천하고픈 책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제 찾아보니 2권에 각각 4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이군요. 가볍게 보려고 했는데, 맘 제대로 먹어야 되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류는 책을 통해 발전해 온 거 같아요. 그만큼 책이 갖는 힘은 강력하다는 거겠지요. :)
저는 우선 영화로 먼저 봐야겠습니다. :D
저도 영화는 아직 못 봤어요.
책을 읽고나니 영화도 꼭 보고 싶어집니다.
우선 영화를 조만간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영화도 평이 괜찮더라고요.
저 긴 내용을 어떻게 영화로 옮겼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고 싶어요. ^^
영화를 두 번쯤 보고 넘 재밌어서 책을 사뒀어요. 책은 아직 못읽었지만요. 비극적인 시대를 살아간 소녀의 동화같은 이야기였어요. 브리님의 독후감으로 만나니 반갑네요^^
영화를 먼저 보셨군요.
전 영화는 못봤지만, 책으로 읽으셔도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조금씩 쪼개서 읽지 마시고 휴일 같은 때 몰아서 읽으시길 추천드려요.
읽고 생각이 많아지는 책입니다.
서점에 내려갔다가와야겠어요 브리님 ㅋㅋ
영화도 있답니다. ㅎㅎㅎ
시간 많을 때 (책이 좀 길어요) 편안하게 자리잡고 앉아서 죽 읽으면 좋을 거예요.
그 감동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요.
화가 샤갈이 생각나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샤갈두 그림과 사랑으로 이겨냈던거같아요.~^^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시대를 어떻게 버텨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