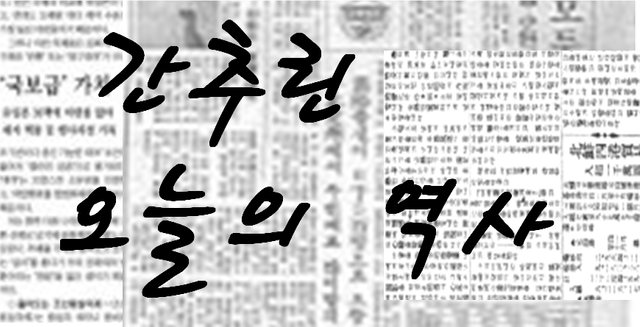간추린 오늘의 역사 12월 6일
1866년 대원군, 경복궁 중건위해 당백전 주조
당백전은 고종 초기에 발행한 동전으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낸 고액화폐이다. 당시 재정의 건전성을 해쳤던 직접적인 원인은 경복궁의 중건이었지만, 외세의 문호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군대를 확장하고 그에 따른 군비의 증가도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원군은 1866년(고종 3)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상평통보 1문의 100배 액면가를 지닌 당백전을 주전하였다(『고종실록』 4년 5월 4일). 당백전 주전은 시급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민간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유통조차 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장령(掌令)최익현(崔益鉉)은 당백전의 폐해를 상세히 기록한 상소를 올려 유통 중단을 요구했다. 당백전은 1868년(고종 5) 10월에 이르러서 통용이 금지되었다.
1907년 13도 창의군 결성
11907년(융희 1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자 영춘(永春)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강년(李康秊), 강원도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킨 민긍호(閔肯鎬), 김천에서 거병한 허위 등 약 1만여 명의 의병, 해산 군인들이 모여 한성 탈환 작전을 벌였으나 사전에 일본군에게 발각되어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하였다가 철군하였으며, 이후 창의군은 한성 인근의 경기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활발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 작전은 독립운동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의병운동으로 평가되며, 항일의병운동 역사에서 본격적인 의병활동이 전개되는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당시는 일제의 밀정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시기로 이들의 공작으로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이 이끄는 부대들이 의병 연합 조직에서 배제되었다.
결국 창의군을 조직하고 한성탈환작전을 기획했던 중군대장 이은찬은 한성에서 밀정에게 속아 순국하였고, 총대장 이인영은 작전 중 부친상을 이유로 문경으로 돌아갔으나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허위가 이인영을 대신해 연합부대를 이끌었으나 1908년 양평에서 일본군에 체포되었고, 이후 창의군은 경기도, 황해도 등지에서 산발적인 전투를 전개해나갔다.
1979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0대 대통령에 최규하 선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실시하는 제10대 대통령선거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헌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그는 단독으로 입후보해 찬성 2천4백 65표, 무효 84표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해 12월 21일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최대통령의 임기는 당선 즉시 개시되어 박정희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984년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79년 11월 10일 특별 담화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헌법을 개정하여 제11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선을 실시,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향후 정치 일정을 밝힌 바 있어 임기는 채우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런 유고로 대통령직에 올라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해 군부의 무력 진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 9개월 만인 1980년 8월 16일 하야하고 말았다. 이후 5.18특별법에 의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어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1991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등 3명 일본정부에 보상요구소송 제기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주요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피해 여성들에게 위로금으로 인도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할머니들에게 거절당해 실패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법적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해결을 요구해야 하는지,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들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양국 국민은 이해할수 있을 것이며 오해도 해소될 것이다.
2011년 일제때 일본으로 강제반출된 『조선왕실의궤』(81종 167책) 돌아옴
오대산 사고(史庫)에 보관되어 오던 것으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81종 167책이 반출되어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다른 한반도 유래 도서 1205책과 함께 의궤 81종 167책 전부를 영구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원래는 반환 목록에 의궤는 없었으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혜문 스님 등의 노력으로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2011년 4월 27일에 반환 법안이 일본 중의원 외무 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1년 4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당시 일본의 집권당이 한국에 유화적이었던 민주당이었던 점이 겹쳐 비교적 순탄하게 환수되었다.
10월 19일 환수가 시작되어, 12월 6일 모든 환수가 완료되었다. 2011년 12월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조선 왕조 도서 환수 기념 특별전을 열었다. 의궤 81종 167책과 왕실 도서 66종 938책이 전시되었다. 2016년 5월 3일 일본 궁내청에서 환수된 조선왕조의궤 81종, 167책 중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68건, 122책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1884년 갑신정변 실패, 김옥균 등 일본으로 망명
1949년 첫 징병검사 실시
1964년 박정희 대통령 서독 방문
1987년 박종팔 WBA 슈퍼미들급 세계챔피언 획득
1990년 프랑스 ‘로피시엘 옴므’지 정명훈을 1990년의 영웅16인 선정
1995년 불국사,석굴암,팔만대장경,종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2018년 손흥민(토트넘) 유럽 프로축구 1부리그100호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