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 발상 004 | 알아줬으면 해서

콜미바이유어네임?
영화의 스토리보단 특유의 감성을 장면으로 만나고 싶어 이끌리듯 보게 되는 영화들이 있다. 배경, 장르, 주제 같은 요소들보다는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선택하게 되는 뉘앙스들. 83년도의 이탈리아 남부라는 것은 내가 보게 될 장면들의 감각을 예측하게 해 주었고, '겪어보지 못한 과거의 향수'라는 것에 집착하는 나의 로망을 채워주기엔 충분했다. 어디에선가 주워 들어 뜻도 모르고 고유명사처럼 익숙하게 알고 있던 "콜미바이유어네임"
무심코 나는 중얼거렸다.
"나를 불러줘, 너의 이름에 의해? 뭔 뜻이야.."
미묘하고도 날 것
아는 것은 많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들에는 서투른 열일곱 살의 엘리오와 미국 남성을 떠올릴 때 갖는 특유의 자유롭고 가끔은 건방져 보이기도 하는 이미지의 올리버. 직관적인 방식으로 친절하게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대사는 없지만, 그래서 더 그 자체인 것처럼 느껴진다. 나폴리인지 포지타노인지 모를 어떤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의 30년 전 누군가와 누군가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잠시 만나볼 뿐인 듯하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그걸 드러내는 방식은 미묘하지만 포장되지 않은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올리버의 성격을 보여주면서도 엘리오가 올리버를 오해하게 만드는 "이따가 봐요.(Later.)"라는 말이나,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서"라는 표현만으로 마음을 고백하는 그 말들의 무게감이 마음에 잔상을 남겼다.
엘리오의 아버지는 모든 걸 알면서도 지켜만 보다가, 다그치지 않고 엘리오에게 말을 건넨다. 사람들은 더 나아지기 위해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기도 전에 망가져버리게 된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위로와 가르침의 방식이 이렇게 조심스럽고 진심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알아줬으면 해서
난 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식의 직설적인 표현보다 은근하지만, 더 잘 느껴진다. 문득 '알아주다.'라는 말이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준다는 뜻인데,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니.
어린 날, 나의 표현 방식은 언제나 경직되어 있었다. 상대가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마찬가지였다. 마음에 대해서 선을 그어 다짐하고 다짐받는 것이 관계를 다지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실망한 사람들을 떠나보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손에 힘껏 꽉 쥐고 있고 싶어 했다. 어쩌면 나를 들여다보는 것에 익숙지 않아서, 타인을 바라봐주는 것에 서툴러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
단편 발상
001 | 낯선 계절의 반복
002 | 바(Bar)의 데시벨
003 | 안경을 쓰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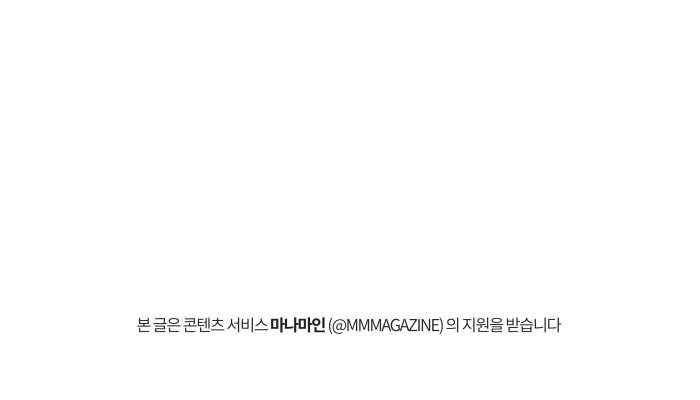
83년도 이탈리아 남부인데 세련됐네요~ 어렸을때는 다들 저렇게 표현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랬구요! ^^ 이 영화 보고싶네요 한번 꼭 볼게요 p님!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렬히 좋아하는 영화라서 뽀애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
다운받고있어요~ 다음주에 볼게요 ^^
어디선가 평을 본 것 같은데 잊고 있었어요. 동성애에 관한 영화 맞나요?
제목은 "날 네 이름으로 불러줘"인데.. 왜 상대방의 이름으로 자기를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동성애가 나오긴 하는데 초점이 그냥 첫사랑에 관한 영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상대의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한 건 아마도 가장 큰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