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77: 이기론에 대해서 (조선 성리학)
생각 77: 이기론에 대해서 (조선 성리학)
일원론
철학적인 사상(事象)의 설명에서 유일의 궁극적인 존재·원리·개념·방법 등을 생각하는 입장 또는 경향의 총칭.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존재론적 일원론:물·불·유(有) 등의 시원(始元)에서 만물의 생성의 설명을 시도한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의 자연학자들이 그 선구자로서 데모크리토스식(式)의 원자론적(原子論的) 다원론과 대립한다. 신을 유일한 궁극자로 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여서, 플로티노스의 유출설(流出說), 그리스도교적 유신론(有神論), 스피노자의 범신론(汎神論) 등이 다시 구별된다.
인식론적(認識論的) 일원론:주관적 일원론으로서 독아론(獨我論), J.S.피히테의 자아(自我)의 이론이 있고, 유심론적 형이상학의 경향을 보이며 유물론과 대립한다.
기타 윤리적 일원론·방법적 일원론 등의 구별도 가능하다.
원래 일원론은 모든 대립을 초월한 보다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입장이므로 형이상학적·존재론적 일원론이 중심이며, 그것이 자연적인 귀결이다.
일원론(一元論)은 볼프에게서 처음으로 나온 말로, 오직 일종(一種)의 실체(물질이나 정신)를 인정하는 철학이다. 예컨대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원론(二元論)이지만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를 실체의 표리(表裏)로 생각했으므로 일원론이다.
이원론 [ dualism, 二元論 ]
세계 또는 인간을 두 개의 상호 독립적인 근본 원리에 의해 설명하려고 하는 견해를 말한다. 즉 상호 대립함으로써 통일될 수 없는 두 계기(契機)로 사물을 설명하는 것이다.
대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원리나 원인으로써 사물을 설명하려는 태도.
정신과 물질의 두 실재를 우주의 근본 원리로 삼는 이론. 17세기에 데카르트가 정신은 의식을 그 속성으로...
선과 악, 창조자와 피조물, 영혼과 몸 따위의 대립되는 원리로써 사물을 설명하려는 입장.
성리학의 이기일원론과 이기이원론
성리학의 이기론에서 만물의 본질적 존재인 이(理)와 만물의 현상적 존재인 기(氣)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 이기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기의 관계를 "이와 기는 서로 뒤섞이지 않으며,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로 정리한다.
존재의 본질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수양철학에서는 이를 중시해야 하므로 전자의 입장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고, 현실의 개혁에 치중하는 실천철학에서는 기를 중시해야 하므로 후자의 입장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뒤섞이지 않음’에만 치중하면 이기이원론으로 발전하고 ‘분리되지 않음’에만 치중하면 이기일원론으로 발전한다.
한국의 성리학에서는 이기일원론의 입장이 일부 수용되었다. 서경덕은 "기 밖에 이가 없으며 이는 기를 주재하는 것"이라 하여 이기일원론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이는 기본적으로는 이기이원론을 계승하면서도 "이와 기는 혼연하여 사이가 없고 서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다른 물건이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기일원론적 입장에 비중을 두었다.
만물의 물질적 존재와 삶의 작용, 인간의 감정 등 인식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모든 요소는 기이다. 기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의 본질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인식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하나로 귀일되는 요소는 이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본질이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의 입장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유교철학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한국의 성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기이원론을 수용하지만,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하는 수양철학에서는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여야 하는 입장 때문에 ‘이’를 중시하였고, 율곡 이이를 중심으로 하는 실천철학에서는 현실을 개혁해야 하는 입장 때문에 존재의 현실적 요소인 ‘기’를 강조하였다.
조선의 멸망
이원론은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일원론의 가치를 이원론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종교적 역사로 보면 다원신에서 유일신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유일신은 제국의 건설과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유일신의 철학이 로마제국의 황제와 동일시 됩니다.
한국 성리학은 이기론 토론의 역사입니다. 궁국적으로 실천및 현실을 중시하는 ‘기’ 보다 본질인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이 학계를 압도하면서 실천과 현실이 등안시 되는 누를 저질릅니다.
그 현실이 일본의 조선침략및 식민지화를 증명이 됐습니다. 비교를 하는 이원론은 가치의 일원론을 설명하는 과정이나 도구로 쓰이면 안성맟춤인데 이원론으로서의 토론으로 발전을 하다보면 당쟁이 발생하며 건설적인 토론이 파과적인 싸움으로 발전을 합니다.
아무리 건설적인 비판도 시간이 흐르면 파괴적으로 될수 밖에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삶입니다. ‘이’와 ‘기’를 혼동하는 누를 저질러서도 않되지만 이와 기의 토론으로 이와 기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실수도 문제입니다.
기대승과 퇴계선생의 이기토론은 학문을 발전시켰고 조선은 모든 면에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 즉 현실정치를 하는 훈구파보다 본질을 중요시하는 ’이’, 사림이 득세를 함으로 조선은 균형을 잃고 현실보다는 학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토론을 하던 학문에서 논쟁만 하던 당쟁을 하게 됩니다.
현실과 이상 중에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둘다 중요한데 균형을 잃으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일원론이니 이원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일원론과 이원론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입니다.
일원론이 득세하면 혹세무인하게 되고 이원론이 득세하면 세상은 논쟁만 벌어져 혼탁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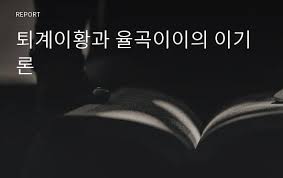
불쌍한 내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