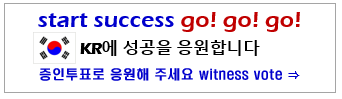벌써 10년입니다.

허망했다. 숫자 0.1과 0.01의 차이를 붙들고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왜 이 결론을 받아들이는 데 오래 걸렸을까. 거대한 악당이 꾸민 음모 탓에 아이들이 희생됐다고 생각해야 마음의 도피처가 생겨서는 아닐까.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평범한 얼굴을 한 공범들이 조금씩 잘못을 쌓아 올리다 한순간에 무너져 발생한 사건이었다. 장훈은 이후 배가 왜 침몰했는지 더 묻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를 누가 출항하도록 허락했는지, 세월호에 하루밖에 타지 않은 선원 전영준은 죗값을 치렀는데 해경청장 김석균은 왜 무죄를 받았는지 같은 질문이다.
"배가 기울고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101분이 있었어요. 그때 구조했다면 참사가 아니라 사고에 그쳤겠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
장훈이 기자에게 물었다.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냐고. 글쎄,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일까. 말을 고르는 사이 답이 돌아왔다.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뭘 해도 그런 일은 생길 수 없죠. 그런데도 돈도 안 되는 연구소를 왜 하냐. 나 같은 불행한 유족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에요. 10년 전 떠난 준형이도 그걸 바랄 겁니다."
매일 매순간 곳곳에 흩뿌려진 사회적 재난의 형태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는 매번 큰 저항에 부딪힌다. 친자본·친기업의 입장에 선 주류 세력은 규제는 비용보다 편익이 클 때만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노동자의 목숨값을 후려쳐 생명 보호의 편익을 최소화시키기에 가능한 논리일 뿐이다.
...
때문에 누군가는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반대할지 모른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나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과연 또 다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나보다 낮은 생명가격표가 붙은 이들에게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곧 나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인식과 담론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각자 자리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하는 것. 추모의 정치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