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말고보통] 당당하고 자유롭고 싶어 소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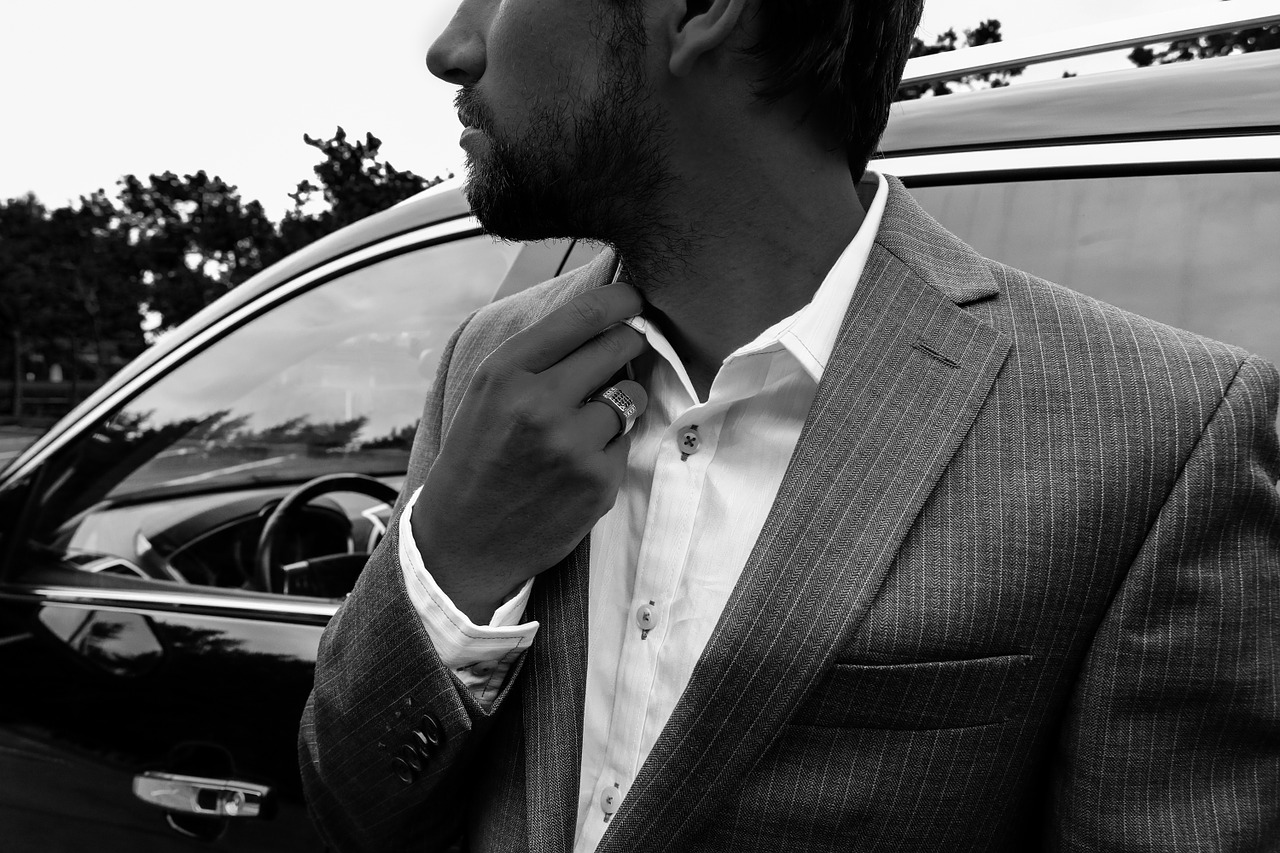
우리는 기호를 소비한다.
지금은 특정한 기호를 소비하는 시대다. 멀리 갈 것 없이 나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 한 때 스포츠 브랜드 ‘져지’(트레이닝 상의)와 ‘운동화’를 엄청나게 사다 모았다. 나는 왜 그것들을 소비했던 것일까? 져지와 운동화를 사면서 활발하고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신분, 계급,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져지와 운동화를 돈을 주고 샀다기보다 역동성, 활발함, 열정이라는 기호를 샀었던 셈이다.
내 경우는 그마나 소박한 편에 속한다. 벤츠를 타고 BMW를 타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옷이나 신발과는 비교도 안 될 고가의 승용차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굳이 고가의 외제차를 사는 이유는 자신의 신분, 계급,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벤츠’라는 특정한 기호를 소비하면서 ‘나는 벤츠를 탈 정도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BMW’라는 특정한 기호를 소비하면서 ‘나는 BMW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는 모두 특정한 기호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런 소비 패턴은 외제 차나 명품 가방과 같은 사치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상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가전제품을 예로 들어보자. 양쪽으로 열리는 대형 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때, 가정주부들은 그것을 갖고 싶어 했다. 내 어머니도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양쪽으로 열리는 냉장고를 보고 돌아온 날은 유독 우울해보였고 짜증도 심했다.
아직도 기억난다. 집에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그 하얀 냉장고가 배달오던 날 어머니 표정이. 그 표정은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행복해보였던 모습 중, 탑 5에 들어갈 정도였다. 어머니는 왜 그리 기분이 좋았던 걸까? 더 냉장이 잘되는 냉장고를 가지게 되어서였을까? 아닐 게다. 그 냉장고가 가진 ‘행복한 중산층 가정’이라는 계급, 위치를 갖고 싶었던 것일 테다. 어머니는 냉장고를 소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그 ‘기호가치’를 소비한 것이다.
당당함을 사려고 소비한다.
이제 기능을 소비하는 것은 촌스럽고 드문 일이 되어 버렸다. 이제 우리는 특정한 기호를 소비한다. 그렇다면 왜 기능이 아니라 특정 계급, 신분, 이미지를 나타내는 기호를 소비하게 된 것일까? 당당해지기 위해서다. 일차적으로 기능을 소비하든 기호를 소비하든 관계없이 일단 소비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당당해진다. 자본주의는 상품보다 돈을 더 우위에 두는 체제다. 상품을 가진 사람보다 돈을 가진 사람이 더 우위에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기능이든 기호든 간에 일단 돈을 쓸 때는 한 없이 당당해진다.
사실 아닌가?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서 옷(상품)을 살 때는 당당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옷(상품)을 가지고 환불(돈) 받으러 가야 할 때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곤 했으니까 말이다. 결국 소비는 당당해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게다. 그도 그럴 것이 돈을 벌 때는 손님 눈치보고, 상사 눈치보고, 사장 눈치를 보아야 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상품)이지만 돈을 쓸 때는 우리가 손님이 되고, 상사가 되고, 사장이 되는 것 같은 당당한 느낌이 드니까 말이다.
돈을 쓴다는 것은 분명 매혹적인 일이다. 뚱뚱한 내게 점원은 건장하다고 말해주고, 어제 치킨을 먹고 자서 얼굴이 팅팅 부었는데도 핼쑥해 보인다고 말해주니까. 그뿐인가? 돈을 쓰러 간 날 종업원은 ‘요즘은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라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나의 일상에 대해 한 없이 궁금해 한다. 이런 경험이 어찌 매혹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일상에서 괄시받고, 천대 받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능이 아니라 기호를 소비하려는 이유 역시 당당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남자들은 반 지하에 살더라도 벤츠, BMW를 타고 싶어 한다. 또 많은 여자들이 가능만 하다면 128개월 할부를 해서라도 샤넬, 에르메스 같은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 한다. 외제차가 국산 차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명품 가방이 다른 가방보다 더 기능적이어서 아니라는 것은 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들은 모두 당당해지고 싶은 것이다. 강남 역에서 여자들을 생태학적으로 관찰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후줄근한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이지만 명품가방을 매고 가는 사람은 그 발걸음에서 이미 여유와 당당함이 묻어난다. 대부분 마찬가지다. 자신이 추구하는 기호를 잘 반영한 옷을 입고 나가는 날이 그렇지 못한 날보다 훨씬 당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려고 소비한다.
소비하는 이유가 당당해지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말하는 월급쟁이는 흔하다. 그렇다면 월급쟁이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항상 정시에 출근해야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사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나와 결이 다른 사람들과 업무를 할 때 느끼는 그 불편함이 직장의 스트레스다. 결국 직장 스트레스의 핵심은 부자유스러움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직장에서 자유는 없다. 월급쟁이에게는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할 자유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자유도, 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을 보지 않을 자유도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직장의 고질적인 스트레스는 쇼핑으로 한 방에 해결된다. 적어도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쇼핑을 할 때는 한 없이 자유롭다. 마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왕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손님은 왕’이라는 수사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사고 싶은 화장품, 목걸이, 옷, 가방, 신발을 마음껏 살 때, 한 없이 자유로운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뿐인가? 우리가 혹여 물건을 사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는 종업원들은 우리를 어찌 대해주었나? 무엇인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눈치를 살핀다. 이처럼 소비를 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롭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맘껏 사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