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화 칼럼] 모욕 공동체에서 3인칭 여성으로 살아가기
리뷰, 김숨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서글픈 모성, 황혼육아
자녀가 결혼을 해서 독립하면 끝이 될 것 같았던 고생이 다시 돌아왔다. 인생의 후반기를 다르게 살겠다는 제2의 인생 계획은 유예되었다. 맞벌이 자녀를 위해, 제2의 인생 대신 제2의 육아시기를 살아야 한다. 황혼육아, 손주병이란 신조어가 생겼다. 몇몇 언론은 황혼육아법을 교육하고, 손주 재롱에 덤으로 경제적 보상까지 얻는 것으로 황혼육아를 포장하기도 한다.
황혼육아는 손주육아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맞벌이 하는 자식 대신 가사노동도 해야 한다. 육아돌보미, 가사돌보미, 이중 직업을 수행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할마들의 고충은 더 심하다. 척추질환, 퇴행성 관절염 등 신체적 어려움만이 아니다. 정신적 심리적 고충은 드러나지 않은 채 모성으로 뭉개진다.
황혼육아 현상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은 한국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고통이 어머니에서 어머니로 전해지는 모계사회라는 점이다. 윗세대 어머니를 착취하면서 작동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진정 그 착취의 성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연쇄적 고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피날레를 장식할 것인가. 김숨의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은 이 끝을 상상해보자고 제안한다.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은 두 여인이 주요인물이다. 소설에서 두 여인은 ‘그녀’와 ‘여자’로 지칭된다. 개별 인격체로서 고유 이름 대신 3인칭 일반호칭으로 불린다. 그녀는 며느리고, 여자는 시어머니이다. 두 여인의 이야기는 공정하게 이끌어지지 않는다. 화자는 며느리, 그녀의 시선으로 여자를 해부한다.
그녀는 홈쇼핑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는 감정노동자이다. 보다 좋은 아파트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직장을 다녀야 하는 그녀는 여자가 필요했다. 혈육에 대한 맹목적 사랑으로, 용돈 수준의 경제적 보상으로 돌봄노동을 전담할 여자가 필요했다. 그녀와 여자의 협력 관계는 거기까지였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직장생활을 하던 그녀가 해고된다. 해고된 후 좁은 아파트에서 마주치는 여자에 대한 그녀의 모욕에 가득찬 시선이 책을 가득 채운다. 그녀는 효용성이 없어진 여자가 꺼림칙하다. 그녀는 여자에게 차갑다. 그러한 그녀를 독자는 비난할 수 없다. 독자도 그녀의 행위와 태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울 뿐이다.
소설은 그녀의 시선 너머 무너지는 여자를 미스터리하게 보여준다. 엄마라는 존재로 묵묵히 침묵 속에서 살아 온 여자였다. 효용가치가 다한 자리에 자신의 침묵, 생존조차 다른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여자는 안다. 여자는 미라처럼 자신을 스스로 화석화하여 자신의 모성이란 업을 마무리한다.
뫼비우스 띠처럼 연결된 여성들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제목에서는 여인들과 적들이 대비된다. 그런데 정작 책 속에 대적하고 있는 것은 여인들이다. 그녀는 여자의 노동을 딛고 임금노동자로 일한다. 그녀는 여자와 종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나이던 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두 종으로 갈라진” 것이며, 여자는 사회적으로 교배가 불가능한 생식적으로 격리된 종이라고 멸시한다. 결국 종이 다른 이들은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
그런데 임금노동자인 그녀는 다른 종인가? 그녀는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종생물이다. 시장의 속도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며,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순식간에 소리 소문 없이 사리지는 생물이다. 생존기간이 짧은 그녀는 퇴출되어 여자의 자리로 돌아온다. 돈을 위해 감정노동을 견디어야 하는 그녀와 침묵하는 돌봄노동 여자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다. 여자의 현재는 그녀의 미래이다. 또한 그들은 도미노 블록과 같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진다.
여자와 그녀의 관계, 부정의한 관계를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가부장제라고 간단하게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답이 아니다. 가부장제라는 체제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소설이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부장제라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맨 아래를 구성하는 여인들, 그들은 하부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분화된다. 그러나 그 변신은 진화로 나아갈 수 없다. 이들은 모성을 벗어나서 진화해서는 안 된다. 모성이란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멸종해서도 안 된다. 진화하지도 멸종하지도 않은 채 여인들은 서로 위안이 되지 못한다.
책 속에서 약자인 여인들이 서로 부딪히며, 서로 상처를 주고, 으르렁거린다. 그녀는 여자를 경멸한다. 그러나 독자는 그녀가 경멸하는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 여인들은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진정으로 그녀가 경멸해야 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해고한 세상이며, 어머니인 여자를 갈 곳 없게 만든 자신의 남편이건만.
피라미드의 기반인 가정은 여성들의 수치와 모욕이 일상화된 공동체이다. 가정 밖의 수모와 부정의를 모두 받아 안는 공동체이다. 어머니와 어머니로 이어지는 착취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속에서, 그를 토대를 선 전체 피라미드 속에서의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작가는 의도적으로 남자를 배제한 체, 그녀와 여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피하고 싶은 여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무너진 모습을 뚫어지게 보게 한다. 그녀와 여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속물적 가치에 삶을 맞추는 치욕의 현장을 부끄럽지만 직시해야 한다. 그럴 때 자신을 경멸하게 만드는 진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화려하지만 잔혹한 세계를 향해 분노를 정조준할 수 있다. 자신을 투영한 구체적 현실 인식만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올 수 있다.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에 기대어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출발해보면 어떨까. 나는 그녀와 여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욕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그 공동체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야기를 해보자. 그와 남자도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해보자. 이것이 누구를 위한 진화인지 물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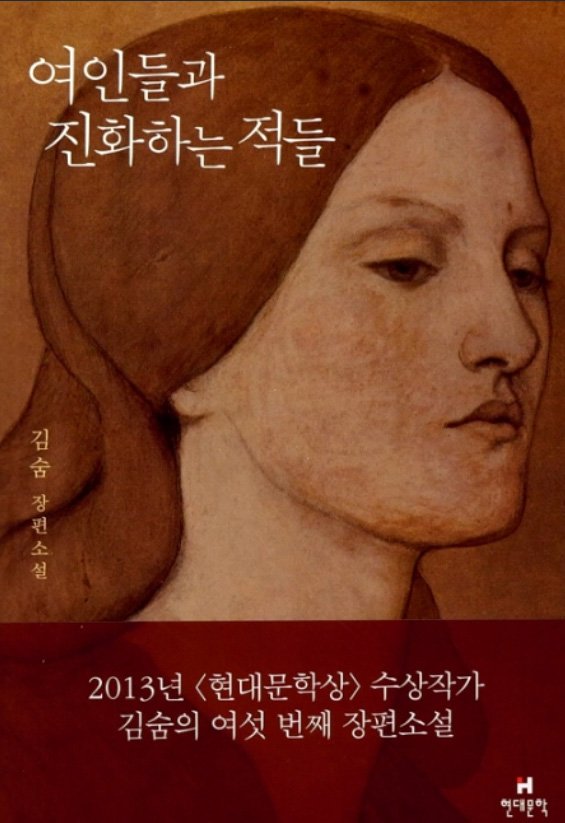
- 글 : 김애화 칼럼니스트
-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 리스팀과 보팅으로 이 글을 응원해주세요
- 민중의소리 스팀잇 공식 계정 (@vop-news)을 팔로우 해주세요
- 여러분의 응원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